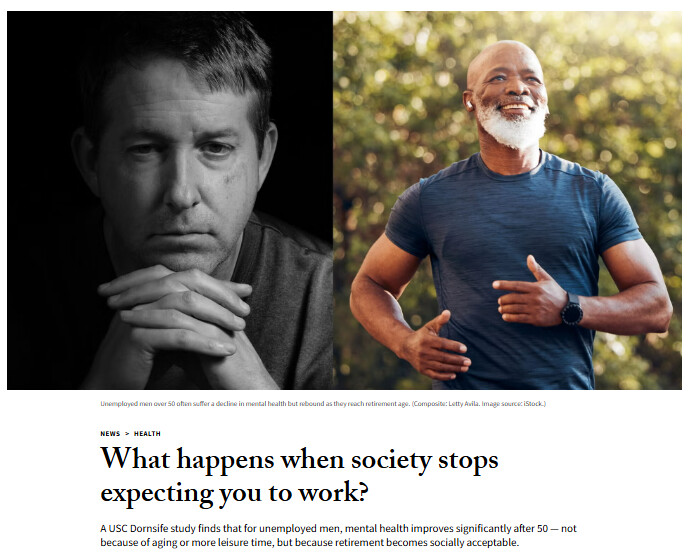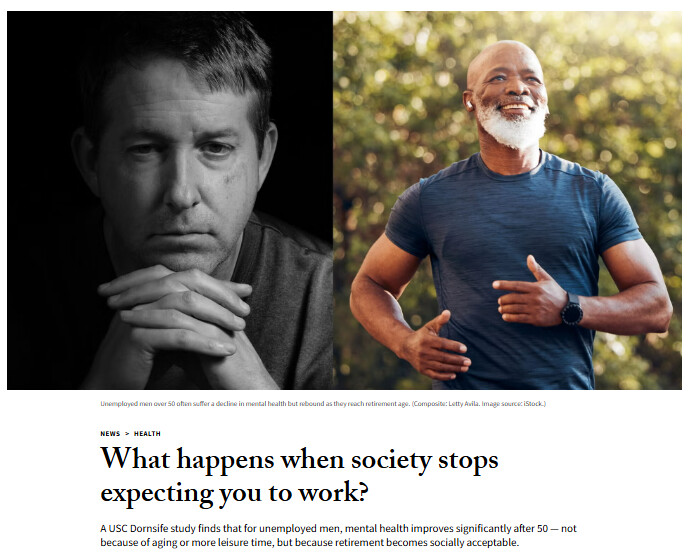
실직 남성들이 50살을 넘어서게 되면 정신적 건강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압박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USC 돈사이프(Dornsife) 연구팀이 10개 유럽 국가들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50살이 넘어서 은퇴 연령에 가까워지는 나이일수록 실직 남성의 정신 건강이 크게 개선되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거나 여가 시간이 늘어서가 아니라,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50살 실직 남성은 직장인에 비해서 우울증이 있다는 증상 보고 비율이 23%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그런데 65살, 즉 은퇴가 일반화되는 시점인 연령에서는 취업자와의 정신 건강 격차가 완전히 사라졌다.
USC 휴먼캐피털연구센터장 티투스 갈라마 교수는 사회적 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그 압박이 사라질 때 정신 건강이 크게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중년 남성들에게는 경제 문제보다 ‘일하지 않는다는 낙인’이 정신적으로 더 큰 압박감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USC 연구팀은 직업이 없는 중년 남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단순한 소득 상실로 인한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 상실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동년배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 실직 상태가 ‘퇴직자’로 다시 전환되는 상황이 되고 그것은 낙인의 완화에 따른, 자존감과 정신 건강 회복으로 이어진다.
이번 연구는 유럽연합(EU) 10개국의 건강·노화·퇴직 조사(SHARE)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국가별 은퇴 연령 차이를 ‘자연 실험’처럼 분석해 나이·소득·건강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했다.
그 결과, 실직 남성의 정신적 고통은 조기 은퇴 연령에 도달한 직후 18%p에 달했고, 그 5년 후에는 37%p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취업 남성을 비롯해서 실직 여성, 장애급여 수급자 등에서는 이 같은 정신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USC 연구팀은 사회적 압박을 매우 심하게 느끼는 현상이 실직 남성 집단에 국한된 사회·문화적 특성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견은 50살 이후 사람의 행복감이 회복된다는 이른바 ‘U자형 행복 곡선’ 이론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평균 수치 뒤에는 특정 집단의 변화가 숨어 있으며, 특히 실직 남성의 정신 건강 회복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USC 연구팀은 앞으로 국가별 실업률, 은퇴 제도 여부, 젊은 실직자 집단 등으로 분석을 확대하고, ‘절망사’(deaths of despair)와의 연관성도 조사할 계획이다.